Ⅰ. 태양을 선택한 나라, 독일을 가다
세계는 이미 태양광 시대
태양 에너지에 대해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
- 아이슬란드 100%
- 미국 17%
- 스위스 62.5%
- 일본 15.6%
- 이탈리아 35.6%
- 영국 29.7%
- 대한민국 3.5%
20년 째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OECD 최하위
※ 출처: Iea, Renewables Information 2018
태양광 발전은 ‘미래의 에너지’가 아니다. 바로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현재의 에너지’다.
무한하고 깨끗한 태양광 발전은 인류의 삶을 크게 바꾸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비율은 20년째 OECD 최하위.
전 세계가 뛰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중앙일보 이노베이션랩은 디지털 기획 콘텐트로 태양광 발전을 집중 조명한다.
태양을 선택한 나라, 독일을 가다
CHAPTER 1.
독일은 어떻게 ‘에너지’를 바꿨을까
CHAPTER 1.
독일은 어떻게
‘에너지’를 바꿨을까
독일에는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 가운데 ‘환경친화적 (Umwelt freundlich)’이란 표현이 있다. “그 사람 굉장히 환경친화적이야!” 이 말은 어디서나 큰 칭찬으로 통한다. 이같은 정서와 철학은 독일이 신재생에너지 강국이 된 밑바탕이다.
독일 경제에너지부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독일에서 생산된 전체 전력 중 태양광·풍력·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36%를 기록했다. 3%대인 한국은 물론 미국·프랑스·영국·일본 등 웬만한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다. 전력 설비규모는 44GW(기가와트). 대형 원자력 발전소 44기의 설비 규모다.
중앙일보 이노베이션랩은 2018년 12월4일부터 8일까지 독일 탈하임 솔라시티, 말비어발트, 프라이부르크 등을 둘러보며 취재했다.
에어컨을 사지 않는 독일
독일의 에너지 정책 방향은 명확하다. 석탄·석유·원자력 등 기존 에너지원 대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일명 ‘에너지전환(Energiewende)’이다. 2000년 신재생에너지 법(EEG)을 만든 이래 20년 가량 일관된 기조다. 독일은 전체 전력 생산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25년까지 40~45%, 2050년엔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독일은 왜 신재생에너지로 산업 전체의 기수를 돌려버린 걸까. 독일태양광협회(BSW) 이사 올리버 베켈은 “독일인들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절약정신(energy -conscious)’과 환경보호 의식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물이든 전기든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기시한다.
개인 주택은 물론 상점에도 에어컨이 없는 경우가 많다. 자연풍이나 지하수를 활용한 서늘한 공기순환 장치, 선풍기로 여름 더위를 이겨낸다. 독일을 찾은 관광객은 4성급 이상 호텔에 자연친화적 공기 순환 장치와 선풍기만 설치된 것을 보고 놀라기도 한다.
이같은 사회적 인식 덕분에 강력한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에도 큰 반대가 없다. 심지어 독일 여론조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서 전기요금을 더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는다.
‘지금보다 미래’ 국민은 안전을 택했다
독일에서도 원자력 발전업계의 반발은 컸다. 2022년까지 기존 원전 가동을 중단한다는 계획 때문이다. 이 반발을 잠재운 것도 여론의 힘이었다.
독일 국민은 1979년 미국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보면서 ‘사고 가능성이 높든 낮든, 원전은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은 아니다’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 특히 체르노빌 사고는 직접 피해를 경험했다. 약 2년 동안 체르노빌 근접 지역 독일 주민은 신선한 샐러드와 유제품 등을 마음대로 먹지 못 했다. 난데없이 통조림 소비가 폭등하기도 했다.
결정적인 한 방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였다.
‘최고의 기술 선진국’ 일본에서 일어난 참사를 목격한 독일인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 독일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옳은 선택 (the right choices)’라고 홍보하고 있다. 독일에서 10년을 거주하며 독일 환경법을 전공한 박근우 박사는 “현재 독일에서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주장하는 순수한 ‘원전론자’는 설 자리가 없다” 고 말한다.
태양광은 ‘연료’가 아닌 ‘기술’
신재생에너지의 양대 축은 태양광과 풍력이다. 특히 독일 알렌스바흐(Allensbach) 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는 태양광을 선호 에너지로 꼽았다. 2018년 상반기 발전 비중만 보면 풍력(육상)이 14.7%로 태양광(7.3%)보다 앞서지만 성장 속도는 태양광이 가장 빠르다. 이유가 뭘까.
글로벌 태양광 솔루션 기업인 한화큐셀의 이안 클로버 커뮤니케이션 책임자는 “태양광 에너지는 ‘연료(fuel)’가 아니라 ‘기술 (technology)’이다. 기술은 갈수록 발전하고 갈수록 싸진다.”라고 말했다. 큐셀은 태양전지와 모듈을 만드는 독일 기업이었는데 2012년 한화그룹이 인수했다. 한화큐셀은 신재생에너지 강국인 독일에서 2018년 태양광 모듈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이미 2017년 한국·미국·일본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도 선두에 올랐다.
이안 클로버는 태양광 발전을 휴대전화에 비교한다. “휴대전화는 20년 전 크기나 두께가 지금의 2~3배였다. 가격은 10배나 비싼데다 성능은 지금의 ‘스마트폰’과 비교할 수조차 없었다. 태양광 발전 기술은 휴대전화와 비슷한 궤적을 밟고 있다. 전 세계와 한국이 해야 할 일은 원자력이냐 태양광이냐 같은 논쟁이 아니다. 정부는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 경쟁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태양을 선택한 나라, 독일을 가다
태양을 선택한 나라, 독일을 가다
CHAPTER 2.
오해와 우려, 이렇게 극복했다
태양광 가격, 드디어 낮아졌다
태양광 발전은 오랫동안 ‘경제성이 없다’고 폄하됐다. 그래서 ‘대체’에너지원 정도로 여겨졌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그 ‘대체’가 ‘대세’가 돼 가고 있다. 기술 발전과 규모의 경제 덕분에 태양광 발전 비용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독일 에너지 전환 정책 연구기관인 ‘아고라 에네르기벤데’에 따르면 2016년 독일 태양광의 균등화발전비용은 kWh(킬로와트시·1시간당 전력량)당 0.06~0.09유로다. 원자력(0.064~0.13유로), 석탄 (0.066~0.11유로), 가스(0.07~0.12유로)보다 저렴하다.
균등화발전비용(LCOE·Levelized Cost of Electricity)이란 발전설비 설치, 유지, 폐기 등 전력 생산 및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고려해 산출한 값으로 발전원의 전력생산 비용을 비교하는 국제 공인 지표다.
‘솔라파워 유럽’에 따르면 1kWp(킬로와트피크·가장 강한 태양빛이 내리쬘 때 얻을 수 있는 전력의 양)당 태양광 발전설비 비용은 2006년 평균 5유로 (약 6400원)이었지만 2016년 1.27유로(약 1620원)로 10년 사이 75%나 떨어졌다.
지붕과 창문, 길바닥이 발전소로
비가 와도 웃는 태양광 발전
태양을 선택한 나라, 독일을 가다
CHAPTER 3.
‘태양의 도시’ 프라이부르크
CHAPTER 3.
‘태양의 도시’ 프라이부르크
독일 남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도시 프라이부르크(Freiburg) 는 태양광이 시민들의 삶 속에 뿌리를 내렸다. 프라이부르크는 ‘검은 숲’이란 별칭을 지닌 슈바르츠발트 산맥 인근에 자리잡은 도시다. 동화 ‘헨젤과 그레텔’에서 어린 남매가 버려진 바로 그 숲이다. 이 곳 농부들은 긴 겨울 동안 각종 목공예품을 만들어 팔았다. 80년대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뻐꾸기 시계’도 원래 이 지역 특산품이다.
아름다운 시청사를 구경하세요
‘+’, ‘-’, ‘0’…어떤 집에서 사시나요
인구 5000여명의 ‘보봉(Vauban)’마을은 프라이부르크에서도 가장 유명한 친환경 지역이다. 철저하게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가치를 지킨다.
마을 중심부는 일부 도로 외에 자동차 진입을 막았다. 보봉 마을에서 구도심까지 갈 때 “차를 타면 30분, 트램을 타면 15분, 자전거를 타면 10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한국 ‘쏘카’의 모델이 된 공유차량 업체가 처음 등장한 곳도 보봉이다.
1994년 이곳에 세워진 '헬리오트롭(Heliotrop)'이란 원통형 태양광 주택은 햇빛을 따라 회전하며 자체 수요량의 5배나 되는 전기를 만든다.
보봉 마을 건물들은 대부분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다. 단열 시스템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한 집이다. 프라이부르크 신 시청사처럼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 조달하는 ‘에너지 제로 하우스’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자체 생산한 전기를 팔아 연간 500만원 안팎의 소득을 올리는 ‘액티브 하우스(active house)’도 생겨나고 있다. 이곳에서 태양광 발전은 미래에 달성해야 할 기술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이 매일 접하고 사용하며 살고 있는 친숙한 에너지다.
잘 살기 위해 ‘환경’을 선택한 사람들
프라이부르크가 어느 날 갑자기 ‘환경 수도’가 된 것은 아니다. 나무가 울창했던 ‘숲’ 지대가 1970년대 산성비로 파괴되는 것을 본 시민들은 각성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석유 파동 때 프라이부르크시는 독일에서 가장 먼저 자가용을 억제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터지자 독일 지방정부 중 최초로 환경보호과를 설치했고 연방 정부보다 14년이나 앞서 ‘탈원전’을 시의회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최근 프라이부르크시는 2018년 3대 현안을 발표했다.
▷보봉과 리젤펠트에 이은 제3의 환경마을 건설 ▷신호와 교차로가 없는 자전거 고속도로 설립 ▷ 친환경 축구장 건설이다. 독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이자, 연간 300만명 이상이 찾아오는 관광도시로 빛나는 프라이부르크. 환경에 대한 확고한 시민의식과 일관된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이 어우러진 결과다.
독일의 에너지전환은 쉽게 이룬 것이 아니다. 장기적인 국가 계획과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 치열한 토론의 결과다. 독일에서는 여전히 대학입시 등 각종 에세이 주제로 신재생에너지가 등장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넘어 안전한 환경, 지속가능한 에너지 발전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비로소 오늘의 ‘태양광 경제강국’ 독일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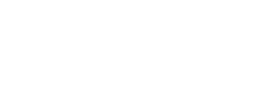
INDEX
기획/취재 이해준·이소아·이정봉 기자 디자인 현인선, 장유진 개발 윤성애
Copyright by JoongAng Ilbo Co.,Ltd. All Rights Reserved